(43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정지용, <향수>)
아까시 꽃냄새가 흐르고, 청보리밭이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이면 충북 옥천 안남면 지수리, 금강 청동여울의 봄이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금강의 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봄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가 굽이쳐 흐르는 금강에서 낚시를 즐긴다. 루어 낚시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길, 금강휴게소에서 라바댐 지나 금강4교, 보청천 합수부 원당교 앞 엘도라도 펜션, 청마교, 합금교, 가덕교 콧구멍다리 또 지나 부연 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길을 달리다 멀리 지수리 취수탑이 보이면 마음의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게 된다.
이 무렵 금강에는 여울마다 금빛 쏘가리를 잡으려는 낚시꾼들이 몸을 담그고 있지만, 나는 쏘가리보다 끄리에 더 관심이 간다. 잉어목 잉어과의 민물 어류로 먹성이 좋은 육식 어종이라 매우 공격적이다. 맛없는 생선으로 알려졌지만, 루어 낚시 대상어로서는 더할 나위 없다. 특히 이맘때 끄리들은 산란기를 맞아 평소의 은빛 체색이 아닌 무지갯빛 화려한 혼인색을 띤다. 혼인색을 띤 씨알 굵은 끄리를 낚시꾼들은 ‘바디끄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금강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손맛이 갈급해도 입맛이 먼저다. 금강휴게소 유원지로 내려가 강변의 한 포장마차에 앉았다. 대여섯 집이 나란히 있는데 쏘가리 매운탕, 빠가사리 매운탕, 부침개, 국수, 도리뱅뱅이 등을 판다.
민물고기 조림을 주문하자 아저씨가 투망을 들고 물가로 내려가 투망질을 한다. 금세 피라미, 마자, 갈겨니, 모래무지 등이 소쿠리에 가득 펄떡인다. 아저씨가 물고기 손질을 할 동안 아주머니는 감자와 무, 대파를 썰고 양념장을 만든다. 민물고기 조림이 냄비에서 보글보글 졸여지기 시작할 때 먼저 주문한 도리뱅뱅이 나왔다. 빙어나 피라미 같은 작은 민물고기들을 팬에 빙 둘러서 튀기듯이 구운 후 양념장을 얹어 깻잎, 고추 등과 함께 먹는 향토음식이다. 도리뱅뱅이과 막걸리 한잔이면 봄날을 느리게 붙잡을 수 있다.기다리던 민물고기 조림이 상에 오른다. 칼칼하고 얼큰한 고춧가루 양념과 담백한 민물 잡고기들이 어우러져 내는 맛은 투박하면서도 깊다. 맛이 뭉클하다고 하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어릴 적 아버지와 강변에서 족대질로 잡은 고기를 감자 넣고 조려 먹던 추억을 떠올리면 시적 허용, 아니 낭만적 허용이 된다. 뻘건 감자와 무를 으깨 밥에 비벼 먹으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 추억의 소울푸드를 안주 삼아 마시는 충청도 소주가 마음 구석구석까지 찌릿하게 한다.
술을 못 먹는 일행이 있는 건 축복이다. 그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차창 밖 굽이굽이 흐르는 금강을 따라 “아까시 아까시 희디흰 꽃 냄새가 홍수로 번지”(김선우, <범람>)는 ‘향수 100리길’의 향기를 온몸에 담는 사이 초록이 생각으로 옮겨와 번진다. 구름과 산과 강물을 보고 있으니 마음 속 근심과 걱정들이 멀어져 점이 되는 풍경과 함께 시야 바깥으로 밀려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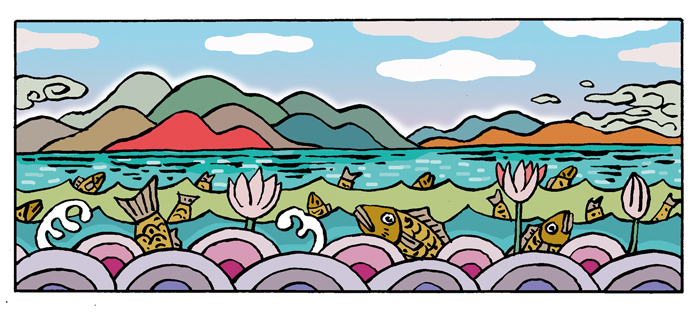
어느새 지수리다. 언제 와도 고향집 같은 ‘등나무가든’에 짐을 푼다. 민박과 식당을 겸하는 집이다. 전화도 안 드리고 그냥 찾았는데, 주인 어르신 내외가 반갑게 맞아주신다. 낚시에 미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집을 찾았는데, 그렇게 드나든 지 벌써 10년쯤 됐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여기 함께 살던 손자는 자기가 키우는 햄스터를 내게 자랑하던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새 대학생이 돼 타지로 나갔다고 한다. 아저씨는 숙원사업이던 마당 연못을 만들어 5짜 쏘가리 두 마리, 4짜 붕어 몇 마리, 잉어, 마자 등등을 넣어두셨다. 내가 마당에 주차하고 내리자마자 이것 좀 보라며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아주머니는 대뜸 “더 훌륭해졌네” 하신다. 나는 뭐가 훌륭한지 모르면서, 어떡해야 훌륭해질 수 있는지 모르면서 어떻게든 훌륭해지기로 마음먹는다.
낚시 준비를 해서 청마대교 밑 여울로 들어갔다. 쏘가리가 나오면 제일 좋고, 끄리 손맛만 봐도 좋다. 역시나 막무가내 우당탕탕 끄리가 루어에 달려든다. 힘이 제대로 붙은 끄리들을 연신 낚아내며 손맛을 즐기고, 잡자마자 사진만 찍고 다시 놓아주는 걸 반복하는데, 저쪽 다리 건너편에 한 백발 어르신이 앉아 낡고 엉성한 낚싯대로 낚시 중이다. 물고기는 못 잡고 강물 위로 흐르는 구름과 바람과 봄볕만 빈 바늘로 건져내고 있다. 그러다 겨우 끄리 한 마리를 잡아내셨다. 하지만 그 한 마리 낚은 게 전부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어르신이 낚싯대를 접더니 겨우 잡은 그 한 마리 맛없는 끄리를, 기생충 감염의 위험을 아는지 모르는지 녹슨 칼로 회 떠 초장 찍어 잡수는 게 아닌가. 나는 미간을 찌푸리다 이내 어르신이 좀 측은했다. 어르신은 내가 팔뚝만 한 끄리 수십 마리를 잡았다가 다시 놔주는 걸 다 봤을 테고, 낡고 망가진 낚싯대와 빈 그물이 꼭 자신의 나이든 처지처럼 여겨져 쓸쓸했을지도 모른다.
끄리 몇 마리를 잡아 어르신께로 갔다. 도마에 묻은 핏물과 마구 썰어 뭉개진 회가 비위생적으로 보였지만 괘념치 않았다. 끄리회 한 점을 정말 맛있게 씹으며 소주를 들고 계신 어르신께 “끄리회 맛있죠. 회 뜨기 좋은 놈으로만 몇 마리 챙겼는데 혼자 먹기엔 많네요.”
큰놈 세 마리를 드리고는 말없이 다시 내 낚시 자리로 왔다. 보리밭에는 초록 바람이 불고, 강물냄새가 머리칼에 배여 마음까지 향기로운 봄날의 금강...
오후 다섯 시가 넘자 늦은 오후의 햇살과 해거름이 뒤섞여 금강이 그야말로 금빛 비단처럼 미끄러진다. 낮 동안 잠잠했던 아까시 향기가 노란 송홧가루와 함께 강물에 실려 오는데, 아아 그 달콤하고 아찔한 들숨! 정신을 차릴 수 없다. 나는 석양에 취해 꽃내음에 취해 그리고 여기저기서 퍽퍽 루어를 때리는 끄리의 손맛에 취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황홀하다. 아까시 향기와 노을이 강과 나를 삼킬 때, 그 오감의 충만함에 내 영혼도 삼켜진다.
늦은 저녁, 등나무가든 마당 평상 위에 아주머니께서 닭도리탕 술상을 봐두셨다. 이 집은 백숙, 닭도리탕, 민물매운탕 등을 하는데, 아주머니 솜씨가 끝내준다. 매콤한 닭도리탕에 술잔을 비우는 사이 다리 밑을 흐르는 여울 물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화음을 이룬다. 맑고 향기로운 평화가 감도는, “밤하늘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금강 지수리, 세월이 아무리 지난다 한들 이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이른 저녁에 벌써 아저씨는 우리가 잘 방에 아궁이 불을 때놓으신 모양이다. 장작불 냄새가 밴 뜨끈뜨끈한 구들장 위에 등을 지지고 누우니 더워서 안 되겠다. 옷을 훌렁 벗어던지고 팬티바람이 되자 그제야 온도가 딱 맞는다.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엔 청산면에 가 어탕국수를 먹어야겠다. ‘찐한식당’의 정겨운 손맛이 아주 찐할 것이다.






